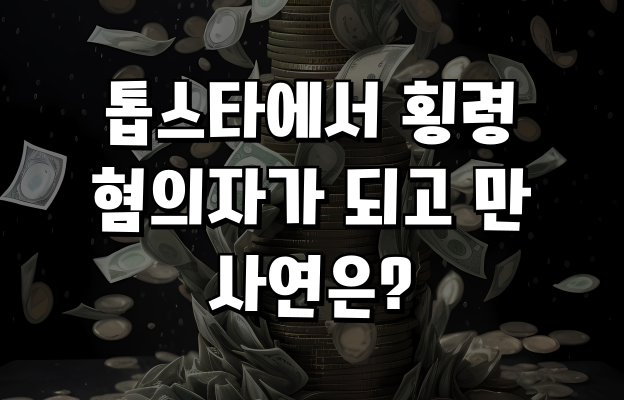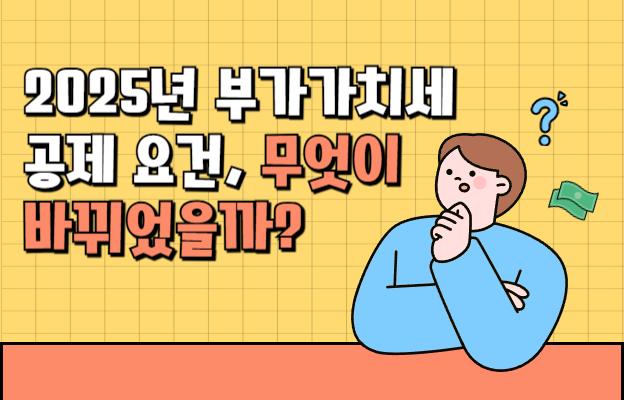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신고납부
BY 전동흔 2024.04.16
조회 2960 4
1. 의의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담하는 것이다.(지법§7⑤) 따라서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대법원2007두10297, 2007.08.23., 참조) 과점주주의 과세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은 최초 과점주주가 된 당시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비율을 적용하고(지령§11①), 이미 과점주주일 경우에 과세과율은 당초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분을 과세비율을 적용하며,(지령§11②) 종전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은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분을 과세비율을 적용한다.(지령§11③)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다음 [표1]과 같이 단계별로 과점주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표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산출구조|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산출세액 =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 장부상 가액 x 과점주주 과세비율 x | 해당 시군별 부동산등 장부가액 | x 2%(중과) |
| 전체 부동산 등 장부가액 |
2.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과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범위
(1)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출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은 현재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최초로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세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주식대금을 완납하는 날이 아니라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명부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주주명부개서일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기장한 토지 등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조심2014지1248, 2014.12.03., 등 다수 참조) [사례]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시기(조심2014지1248, 2014.12.0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어서 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2)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 범위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10④)상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비상장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간주납세의무의 과세범위는 과점주주 당시의 법인 장부상의 토지 등 과세 대상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두11399, 2008.03.14., 판결 참조). 이 때 법인 장부가액의 범위는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당초 법인이 취득한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다.(조심2018지473, 2018.10.08., 등). 또한 당해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된다(조심2018지744, 2018.08.27., 참조). [사례] 감가상각대상 과세물건에 대한 과점주주의 과세표준범위(조심2018지473, 2018.10.08)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 의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 의제 당시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대법원2007두11399, 2008.3.14.)바, 2015년말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장부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사례] 재평가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조심2018지744, 2018.08.27)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사례] 재평가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조심2018지744, 2018.08.27) 쟁점부동산을 재평가하여 자산평가이익으로 계상하여 그 평가 증가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한 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결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점, 설령 취득세 납세 이후 쟁점부동산 평가를 다시 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법인을 평가하므로 쟁점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최근 K-IFRS도입과 관련하여 시가법에 의거해 장부를 기장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법인장부상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 취득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즉,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경우 부동산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되는지가 쟁점의 중심이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10.42)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 등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면서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이 시가를 공신력있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여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한 장부상 가액을 기장처리한 것이라면 감가상각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간주납세의무의 과세범위는 과점주주 당시의 법인 장부상의 토지 등 과세 대상에 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2007두11399, 2008.03.14., 판결참조) 이 경우 법인 장부가액의 범위는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당초 법인이 취득한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다.(조심2018지473, 2018.10.08., 등) 더불어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손상차손을 한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된 당시의 법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 과세표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과점주주의 법인장부가액과 관련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조심2023지2016, 2024.01.16., 등 다수) [사례] 재고자산평가충담금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조심2023지2016, 2024.01.16)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83누103, 1983.12.13., 판결 참조), 이러한 방식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겠다는 의미이지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해서 그 성격을 불문하고 자산총액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자산의 마모, 손실 등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과 달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가정을 섞어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라서 당초의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토지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의제 당시의 가액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쟁점법인의 2019년 당시 매입가격은 OOO원이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도 분양용지 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의 가액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차감되지 않은 분양용지 명목으로 기장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과점주주의 유형별 과세비율의 적용
(1) 과점주주의 유형구분
지령(§11)에 의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와 관련하여 3가지 유형(최초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종전 과점주주)이 있는바 최초 과점주주 (지령§11①)의 경우 과세범위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이 과세범위를 『전체 지분』으로 한다. 이미 과점주주(지령§11②)의 경우 과세범위는 과점주주 주식 취득당시 지분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범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종전 과점주주(지령§11③)의 경우 과세범위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지분증가분』만을 과세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점주주될 당시의 과점주주가 어떤 유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과세비율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2) 과점주주 과세비율 산정시 주주자격 요건 : 주식보유요건 충족설과 불요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인바, 기본적으로 『주주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은 지령(§10의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식취득일 당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판단은 『주식보유요건불요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주주와 주주가 아닌 자가 특수관계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추가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참조)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와 납세의무 판단(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2012두12495, 2013.07.25., 판결).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리는 기 발행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 ※ 대법원 결정(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도 동일한 취지임. 그러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증가분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1823, 2010.05.03). 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전액 또는 일부 이전받아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되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조심2018지23, 2018.05.28), (대법원2007두6588, 2008.02.29., 참조 등).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범위(조심2018지23, 2018.05.28)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대법원2012두12495, 2013.7.25). 청구법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청구법인, ○○이 법인설립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임(3) 과점주주의 과세비율 적용기준 :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비율은 지령(§11)의 규정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과점주주』 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이미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특수관계를 가진 그룹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 그룹의 구성이 변동되더라도 그룹전체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과점주주의 과세비율이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이 있다. 일방관계설은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다른 주주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쌍방관계설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도 각각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서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들간의 특수관계가 쌍방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적 관계」가 형성되면 이들을 전부 특수관계인으로 보이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2008두150, 2011.07.21., 참조). [판례]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대법원2008두150, 2011.07.2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음.(4)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시 과세비율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의 의미는 지령(§10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요건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판단과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변동여하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비율을 지령(§11)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의 과점비율을 초과하여야 그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과세하게 된다. (조심2021지2086, 2022.05.18., 등 참조) [사례] 본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조심2021지2086, 2022.05.18)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바,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BBB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지기법」은 제2조 제1항 제34호를 신설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BBB를 기준으로 할 때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지기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참조), 위 제34호 후단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BB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사례] 주식의 포괄이전과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적용(조심2021지2713, 2022.05.18)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지특법」제57조의2 제5항에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비록 「지특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가 아닌 85%까지만 감면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기법」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 집단내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4.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과 납세지
(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세액 안분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지령(§19①)에 의거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경우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별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ㆍ군ㆍ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는 해당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과점주주의 장부가액과 과세비율이 결정되면 각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별로 해당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한 다음 여기에 과점주주 과세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시ㆍ군ㆍ구별 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도 있다.(2) 과점주주의 신고납부와 납세지 : 물건소재지설과 비상장법인소재지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의 납세지별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서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주소지관할지설, 대상법인소재지관할지설, 당해 물건소재지관할지설이 있으나 「당해 물건소재지관할지설」이 타당하다. 과점주주의 납세지는 아래 [표2]와 같이 지방세법(§8①)에 따른 납세지를 기준으로 한다.정리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취득세는 당해 물건소재지별로 납세하되 각종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소재지 관할시도가 납세지가 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표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지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5. 결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점주주 과세비율이 증가된 경우 및 종전 과점주주 이었으나 다시 주식 등을 취득하여 종전과점주주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과세범위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과점주주 과세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 있지만 그 취득후 수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거나 재평가 등을 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인 『주주명부 개서일』 현재의 비상장법인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점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서 의제하는 과세표준인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인 만큼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과점주주의 법인장부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조심2023지2016, 2024.01.16., 등 다수). 이는 해당 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그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겠다는 의미이지 자산의 차감계정이라고 해서 그 성격을 불문하고 자산총액에서 무조건 차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자산의 마모, 손실 등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과 달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수의 가정을 섞어 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라서 당초의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토지공시가액이 매년 상승하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의제 당시의 가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지로 그 동안의 과점주주 과세표준의 적용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는데 한계가 있다.최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