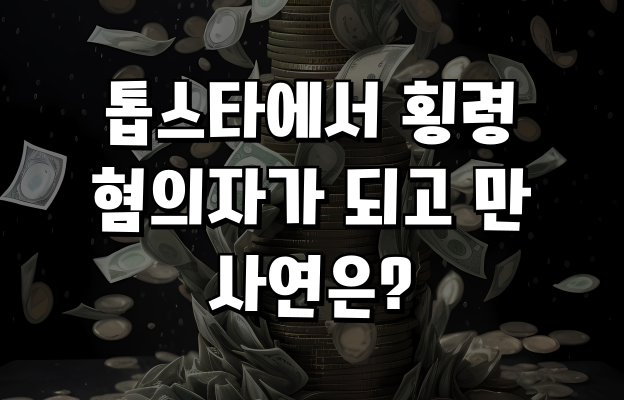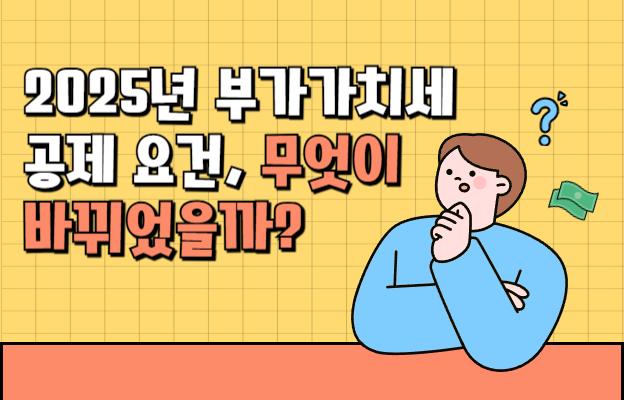■ 기업 연혁 및 현황
무신사는 2001년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온라인 스트리트 패션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이후 패션 관련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대했고, 2009년에는 커머스 기능을 도입한 '무신사 스토어'를 공식 론칭하며 본격적인 이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신사는 단순 판매 중개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강화하며 성장했다. 프리미엄 디자이너 브랜드 플랫폼 '29CM',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 등을 인수하거나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왔다. 또한, 자체 상표(PB) '무신사 스탠다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신진 디자이너 및 중소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패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며 종합 패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 핵심 비즈니스 모델: "브랜드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브랜드 패션 플랫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고 판매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무신사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입점시켜 브랜드 자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 성장의 과실을 플랫폼과 브랜드가 함께 나누는 '동반 성장'도 추구한다. 이러한 전략은 ‘스트리트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도권 브랜드 및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커버낫', '디스이즈네버댓', '앤더슨 벨', '쿠어' 등 다수의 브랜드가 무신사 스토어 입점 초기부터 함께 성장하여 현재는 백화점에서도 주목받는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이처럼 브랜드와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성장을 지원하는 생태계 조성은 무신사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선 무신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명 브랜드가 많은 고객을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한편, 또 플랫폼은 새로운 브랜드와 기존 브랜드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낸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시장 점유율 및 경쟁 위상
2024년 기준, 무신사의 연간 거래액은 4조 5,000억 원이다. 이는 약 32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약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는 무신사가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측면에서도 무신사 앱은 761만 명, 자회사인 29CM 앱은 169만 명을 기록했으며, 2024년 4월 기준 무신사 앱의 활성 기기 수가 980만 대에 달하는 등 높은 사용자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패션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무신사가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막강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이라는 강점과 브랜드 파워 덕분이다. 또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커머스 시장 내 점유율이 약 5% 정도인데, 이는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무신사가 거대 종합 이커머스 기업들과도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핵심 분야인 패션 카테고리 내 점유율이 14%라는 것은 해당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주요 자회사 및 기여도
무신사는 다수의 종속회사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29CM: 25~39세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하는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플랫폼이다. 감도 높은 브랜드와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2024년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전년 대비 +54%)하는 등 무신사 전체 거래액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에스엘디티(SLDT):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Soldout)'을 운영한다. 2024년 영업 적자가 150억 원으로 2023년의 288억 원 대비 개선되면서, 무신사 연결 기준 이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무신사 파트너스: 유망 패션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며,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무신사 재팬: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국내 브랜드의 일본 시장 안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처럼 29CM, 솔드아웃과 같은 전문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인수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신사가 핵심 브랜드의 희석 없이 다양한 시장과 소비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29CM’의 감각적인 큐레이션을 통한 빠른 성장과 ‘솔드아웃’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러한 멀티 브랜드 플랫폼 전략의 성공을 입증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W컨셉: 2030 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며,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 채널과의 시너지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액 성장세가 29CM에 비해 다소 주춤하며 MA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9CM (무신사 자회사): '감도 높은' 브랜드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점으로 25~39세 여성 고객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이구갤러리' 등을 통한 O4O 경험 제공에도 적극적이며, 높은 거래액 성장률과 타겟 고객층 MAU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W컨셉: 2030 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며,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 채널과의 시너지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액 성장세가 29CM에 비해 다소 주춤하며 MA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9CM (무신사 자회사): '감도 높은' 브랜드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점으로 25~39세 여성 고객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이구갤러리' 등을 통한 O4O 경험 제공에도 적극적이며, 높은 거래액 성장률과 타겟 고객층 MAU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에이블리 & 지그재그: MZ세대를 중심으로 동대문 기반 패션 상품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들이다. 최근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하며 무신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AI 기반 개인화 추천과 셀러 지원 프로그램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통해 높은 MAU 성장률과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지그재그는 MAU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셀러 지원 강화 및 빠른 배송 서비스 '직진배송'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형 종합 이커머스: 쿠팡과 네이버는 막강한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패션 및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와 편의성은 무신사를 포함한 모든 버티컬 플랫폼에게 광범위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 백화점 온라인몰 (SSF샵, 롯데온, Hmall 등): 자체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오프라인 매장 연계 O4O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SF샵과 LF의 LF몰은 자사 브랜드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백화점 온라인몰은 전문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온라인 정체성이나 사용자 경험(UX) 제공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 자라, H&M 등): 강력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와 기본 아이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탑텐, 스파오 등 국내 SPA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들과 직접 경쟁한다. ▶ 뷰티 리테일러 (올리브영, 다이소 등): 올리브영은 H&B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이며, 다이소는 초저가 뷰티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경쟁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무신사 뷰티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쟁 환경이다.
■ 재무제표 분석
● 매출은 지속적 성장 ●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크지만, 최근 크게 성장 ● 불안정한 수익 구조가 최근 안정화
| (단위 : 억) |
2021 |
2022 |
2023 |
2024 |
| 매출 |
4,612 |
7,083 |
9,931 |
12,427 |
| 성장률 |
|
53% |
40% |
25% |
| 영업이익 |
585 |
31 |
(86) |
1,028 |
| 당기순이익 |
1,153 |
(558) |
(14) |
698 |
| 영업현금흐름 |
868 |
7 |
(710) |
4,569 |
| CAPEX |
(561) |
(587) |
(1,368) |
(820) |
| 주주귀속현금흐름 |
307 |
(580) |
(2,078) |
3,749 |
■ 종속기업 실적표
무신사 종속기업의 실적은 happy 하지 않다. 대부분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에스엘디티의 영업손실 규모가 매우 크다. 이로인해, 무신사의 영업이익은 종속기업이 아닌 지배기업(모기업)에서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지배기업 손익계산서
그럼, 지배기업의 실적은 어떨까? 무신사의 별도 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ments) 중 손익계산서를 DART에서 조회해 보았다. 지배기업에서는 영업이익 1,124억 원이 발생하여 위 종속기업의 영업손실을 상쇄하면서 연결 영업이익 1,028억 원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위 종속기업 영업손실 합계가 5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지배기업 영업이익 1,124억과 연결 영업이익 1,028의 차이인 96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시 재무제표만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 위 지배기업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바로 금융비용 1,36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1,124억 원이 당기순손실 (-)262억 원으로 적자 반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 수익도 786억 원으로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주석에서 "금융 수익 금융비용"의 내역을 확인하자.

▶ 주석을 보니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 조정 이익(손실)이라는 다소 생소한 항목이 전기 대비 급격히 증가한 큰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보통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익"으로 표현되는 항목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현황을 살펴보자.

▶ 먼저,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 상환전환우선주 부채는 1,379억,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는 475억 원으로 총합계 1,854억 원이 잔존한다. 따라서 유동성 상환 전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이익 1,110억 원이,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손실 476억 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주석을 통해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

▶ 지배기업은 6차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약 5,500억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중 전기인 2023년 발행한 제3종 발행 금액이 2,400억 원이며, 이는 아래 현금흐름표 전기 숫자에서 확인된다.

▶ 그리고 아래 자본변동표를 보면, 전기에 발행한 2,400억 원 중 1,800억원 가량이 ‘자본’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는 부채로, 나머지 일부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로 계상한 부분에서 2024년에 약 1,378억 원의 손실과 652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부채(RCPS)는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redemption right)를 보유하므로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래 주석을 통해 확인된다. 주석에서 회사는 전환권 가치 약 3,553억 원을 자본으로 분류해 오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임을 알 수 있다.

▶ 회제이-00094는 KIFRS1032의 예외 규정의 역할을 한다. KIFRS1032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나 전환비율이 유동적(variable)일 때,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제이-00094는 특정한 경우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환권 가치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과 부채 간 분류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서 손익은 왜 발생한 것일까? 그 손익으로 인해 지배기업의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적자 반전해 버렸다. 이 손익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무신사의 경우는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 특이해 보이는데, 이를 상계하여 순 액으로 4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본다. 먼저 이 손익은 전환권(conversion feature)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환우선주는 고정배당을 받는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지만, 투자자가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보통주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전환 차익 예상분이 기업입장에서 손실(loss)로 인식된다. 즉, 지배기업인 무신사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에 포함된 1,102억 원은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전환 이익을 기업입장에서 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가 이익(profit)을 얻는데 기업은 왜 손실(loss)을 계상할까?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topic이다. 단순명료하게 설명하면, 기존 주주가 상대적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순자산은 곧 기존 주주의 지분이고 이 지분의 증가는 이익, 감소는 손실이다. 제3자인 전환우선주 투자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기존 주주지분을 일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져감을 의미한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전환권이 부여된 증권을 발행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dilution)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손실로 보는 것이다. 이 손실은 실제 현금유출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의 유출과는 무관하다. 즉, 손실로 인식된 부채 부분은 추후 실제 전환권 행사 시 자본으로 대체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자본이 증가하여 총자본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다 (zero sum)이다. 그러나 손실이 인식되는 회계기간과 자본이 증가하는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손실이 발생한 회계기간에는 손실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재무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나타나, 중대한 회계적 이슈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신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변화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연결 손익계산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지배기업인 무신사의 별도 재무제표(separate fiancial statments) 차원이지만, 동 효과는 연결손익계산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럼, 연결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연결손익계산서는 별도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즉, 당기순이익 698억 원이 발생하면서 별도 재무제표와 대비를 이룬다. 별도 재무제표와 비교해 보면 금융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
별도 재무제표 |
연결 재무제표 |
차이 |
| 금융수익 |
786 |
1,244 |
+458 |
| 당기순이익 |
(-)262 |
692 |
954 |
▶ 아래 주석 "30. 금융 수익과 금융비용"을 보면 위 차이 금액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임을 알 수 있다. 즉, 별도와 연결의 차이는 종속기업이므로 종속기업에서 금융 부문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 아래는 종속기업 재무 정보 현황이다. 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추측건대, 펀드와 조합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종속회사 대부분이 영업손실이므로 361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ㅇㅇ업이익의 출처를 공시 재무제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3(당) 기말

■ 재무제표 분석 결과 요약
위에서 보았듯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 항목에서는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인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 사이 항목을 "영업외손익"이라고도 하는데 IFRS에는 성격별로 금융 손익과 기타 손익으로 구분한다. 영업외손익의 변동성은 기업가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임을 알 수 있게 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무신사 주식 가치 평가
올리브영, 다이소와 마찬가지로 무신사의 주식 가치 평가 시 적용할 최초 현금흐름(FCF)은 NOPAT(Net Operating Income after Tax)을 적용하였다. 이 값의 21배인 2조 원이 무신사의 총주주 지분가치로 계산된다. 이 값은 최근의 Stock option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한 주가와 거의 일치한다. 즉, 필자의 평갓값은 경영진의 평갓값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 FCF = NOPAT = EBIT x (1-t)
| (단위 : 억) |
2021 |
2022 |
2023 |
2024 |
| 매출 |
4,612 |
7,083 |
9,931 |
12,427 |
| 성장률 |
|
53% |
40% |
25% |
| 영업이익 |
585 |
31 |
(86) |
1,028 |
| 당기순이익 |
1,153 |
(558) |
(14) |
698 |
| 영업현금흐름 |
868 |
7 |
(710) |
4,569 |
| CAPEX |
(561) |
(587) |
(1,368) |
(820) |
| 주주귀속현금흐름 |
307 |
(580) |
(2,078) |
3,749 |
▶ multiple

▶ Stock Option 부여시 적용한 주식가치

● 검토 의견
이번 올다무(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3사는 K-Culture, K-Beauty에서 MZ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3개 사의 이론적으로 계산된 총주주 지분가치(총 주식 가치) 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Olive young |
Daiso |
MUSINSA |
| 총주식가치 |
5.3조 |
5.3조 |
2조 |
본 칼럼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판단은 독자의 몫임을 밝힙니다. 이 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택스넷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재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W컨셉: 2030 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며,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 채널과의 시너지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액 성장세가 29CM에 비해 다소 주춤하며 MA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9CM (무신사 자회사): '감도 높은' 브랜드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점으로 25~39세 여성 고객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이구갤러리' 등을 통한 O4O 경험 제공에도 적극적이며, 높은 거래액 성장률과 타겟 고객층 MAU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에이블리 & 지그재그: MZ세대를 중심으로 동대문 기반 패션 상품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들이다. 최근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하며 무신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AI 기반 개인화 추천과 셀러 지원 프로그램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통해 높은 MAU 성장률과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지그재그는 MAU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셀러 지원 강화 및 빠른 배송 서비스 '직진배송'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형 종합 이커머스: 쿠팡과 네이버는 막강한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패션 및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와 편의성은 무신사를 포함한 모든 버티컬 플랫폼에게 광범위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 백화점 온라인몰 (SSF샵, 롯데온, Hmall 등): 자체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오프라인 매장 연계 O4O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SF샵과 LF의 LF몰은 자사 브랜드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백화점 온라인몰은 전문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온라인 정체성이나 사용자 경험(UX) 제공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 자라, H&M 등): 강력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와 기본 아이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탑텐, 스파오 등 국내 SPA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들과 직접 경쟁한다. ▶ 뷰티 리테일러 (올리브영, 다이소 등): 올리브영은 H&B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이며, 다이소는 초저가 뷰티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경쟁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무신사 뷰티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쟁 환경이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W컨셉: 2030 여성을 타겟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며,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오프라인 채널과의 시너지도 추구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액 성장세가 29CM에 비해 다소 주춤하며 MA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9CM (무신사 자회사): '감도 높은' 브랜드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강점으로 25~39세 여성 고객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이구갤러리' 등을 통한 O4O 경험 제공에도 적극적이며, 높은 거래액 성장률과 타겟 고객층 MAU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에이블리 & 지그재그: MZ세대를 중심으로 동대문 기반 패션 상품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들이다. 최근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하며 무신사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에이블리는 AI 기반 개인화 추천과 셀러 지원 프로그램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통해 높은 MAU 성장률과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지그재그는 MAU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셀러 지원 강화 및 빠른 배송 서비스 '직진배송'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형 종합 이커머스: 쿠팡과 네이버는 막강한 자본력과 물류 경쟁력,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패션 및 뷰티 카테고리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와 편의성은 무신사를 포함한 모든 버티컬 플랫폼에게 광범위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 백화점 온라인몰 (SSF샵, 롯데온, Hmall 등): 자체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오프라인 매장 연계 O4O 전략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SSF샵과 LF의 LF몰은 자사 브랜드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백화점 온라인몰은 전문 플랫폼에 비해 차별화된 온라인 정체성이나 사용자 경험(UX) 제공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 자라, H&M 등): 강력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와 기본 아이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탑텐, 스파오 등 국내 SPA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 구도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들과 직접 경쟁한다. ▶ 뷰티 리테일러 (올리브영, 다이소 등): 올리브영은 H&B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자이며, 다이소는 초저가 뷰티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경쟁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특히 무신사 뷰티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에 안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쟁 환경이다.

 ▶ 위 지배기업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바로 금융비용 1,36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1,124억 원이 당기순손실 (-)262억 원으로 적자 반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 수익도 786억 원으로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주석에서 "금융 수익 금융비용"의 내역을 확인하자.
▶ 위 지배기업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바로 금융비용 1,366억 원이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1,124억 원이 당기순손실 (-)262억 원으로 적자 반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 수익도 786억 원으로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주석에서 "금융 수익 금융비용"의 내역을 확인하자.  ▶ 주석을 보니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 조정 이익(손실)이라는 다소 생소한 항목이 전기 대비 급격히 증가한 큰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보통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익"으로 표현되는 항목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현황을 살펴보자.
▶ 주석을 보니 "상환전환우선주(RCPS) 부채 조정 이익(손실)이라는 다소 생소한 항목이 전기 대비 급격히 증가한 큰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보통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익"으로 표현되는 항목으로 추정된다.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현황을 살펴보자.  ▶ 먼저,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 상환전환우선주 부채는 1,379억,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는 475억 원으로 총합계 1,854억 원이 잔존한다. 따라서 유동성 상환 전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이익 1,110억 원이,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손실 476억 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주석을 통해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
▶ 먼저,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성 상환전환우선주 부채는 1,379억,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는 475억 원으로 총합계 1,854억 원이 잔존한다. 따라서 유동성 상환 전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이익 1,110억 원이, 비유동 상환우선주 부채에서 평가손실 476억 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주석을 통해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  ▶ 지배기업은 6차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약 5,500억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중 전기인 2023년 발행한 제3종 발행 금액이 2,400억 원이며, 이는 아래 현금흐름표 전기 숫자에서 확인된다.
▶ 지배기업은 6차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약 5,500억가량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중 전기인 2023년 발행한 제3종 발행 금액이 2,400억 원이며, 이는 아래 현금흐름표 전기 숫자에서 확인된다.  ▶ 그리고 아래 자본변동표를 보면, 전기에 발행한 2,400억 원 중 1,800억원 가량이 ‘자본’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는 부채로, 나머지 일부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로 계상한 부분에서 2024년에 약 1,378억 원의 손실과 652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그리고 아래 자본변동표를 보면, 전기에 발행한 2,400억 원 중 1,800억원 가량이 ‘자본’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의 일부는 부채로, 나머지 일부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로 계상한 부분에서 2024년에 약 1,378억 원의 손실과 652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부채(RCPS)는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redemption right)를 보유하므로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래 주석을 통해 확인된다. 주석에서 회사는 전환권 가치 약 3,553억 원을 자본으로 분류해 오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임을 알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부채(RCPS)는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redemption right)를 보유하므로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상당 부분이 자본으로 분류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래 주석을 통해 확인된다. 주석에서 회사는 전환권 가치 약 3,553억 원을 자본으로 분류해 오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임을 알 수 있다.  ▶ 회제이-00094는 KIFRS1032의 예외 규정의 역할을 한다. KIFRS1032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나 전환비율이 유동적(variable)일 때,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제이-00094는 특정한 경우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환권 가치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과 부채 간 분류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서 손익은 왜 발생한 것일까? 그 손익으로 인해 지배기업의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적자 반전해 버렸다. 이 손익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무신사의 경우는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 특이해 보이는데, 이를 상계하여 순 액으로 4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본다. 먼저 이 손익은 전환권(conversion feature)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환우선주는 고정배당을 받는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지만, 투자자가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보통주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전환 차익 예상분이 기업입장에서 손실(loss)로 인식된다. 즉, 지배기업인 무신사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에 포함된 1,102억 원은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전환 이익을 기업입장에서 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가 이익(profit)을 얻는데 기업은 왜 손실(loss)을 계상할까?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topic이다. 단순명료하게 설명하면, 기존 주주가 상대적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순자산은 곧 기존 주주의 지분이고 이 지분의 증가는 이익, 감소는 손실이다. 제3자인 전환우선주 투자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기존 주주지분을 일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져감을 의미한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전환권이 부여된 증권을 발행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dilution)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손실로 보는 것이다. 이 손실은 실제 현금유출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의 유출과는 무관하다. 즉, 손실로 인식된 부채 부분은 추후 실제 전환권 행사 시 자본으로 대체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자본이 증가하여 총자본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다 (zero sum)이다. 그러나 손실이 인식되는 회계기간과 자본이 증가하는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손실이 발생한 회계기간에는 손실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재무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나타나, 중대한 회계적 이슈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신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변화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회제이-00094는 KIFRS1032의 예외 규정의 역할을 한다. KIFRS1032에서는 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나 전환비율이 유동적(variable)일 때,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제이-00094는 특정한 경우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 기업들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전환권 가치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과 부채 간 분류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서 손익은 왜 발생한 것일까? 그 손익으로 인해 지배기업의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적자 반전해 버렸다. 이 손익은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무신사의 경우는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더 특이해 보이는데, 이를 상계하여 순 액으로 45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본다. 먼저 이 손익은 전환권(conversion feature)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환우선주는 고정배당을 받는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지만, 투자자가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보통주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전환 차익 예상분이 기업입장에서 손실(loss)로 인식된다. 즉, 지배기업인 무신사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에 포함된 1,102억 원은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전환 이익을 기업입장에서 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가 이익(profit)을 얻는데 기업은 왜 손실(loss)을 계상할까?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topic이다. 단순명료하게 설명하면, 기존 주주가 상대적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순자산은 곧 기존 주주의 지분이고 이 지분의 증가는 이익, 감소는 손실이다. 제3자인 전환우선주 투자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는 기존 주주지분을 일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가져감을 의미한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전환권이 부여된 증권을 발행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dilution)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부분을 손실로 보는 것이다. 이 손실은 실제 현금유출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자원의 유출과는 무관하다. 즉, 손실로 인식된 부채 부분은 추후 실제 전환권 행사 시 자본으로 대체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자본이 증가하여 총자본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다 (zero sum)이다. 그러나 손실이 인식되는 회계기간과 자본이 증가하는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손실이 발생한 회계기간에는 손실과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재무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나타나, 중대한 회계적 이슈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신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변화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연결손익계산서는 별도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즉, 당기순이익 698억 원이 발생하면서 별도 재무제표와 대비를 이룬다. 별도 재무제표와 비교해 보면 금융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 연결손익계산서는 별도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영업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즉, 당기순이익 698억 원이 발생하면서 별도 재무제표와 대비를 이룬다. 별도 재무제표와 비교해 보면 금융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 아래는 종속기업 재무 정보 현황이다. 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추측건대, 펀드와 조합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종속회사 대부분이 영업손실이므로 361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ㅇㅇ업이익의 출처를 공시 재무제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3(당) 기말
▶ 아래는 종속기업 재무 정보 현황이다. 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추측건대, 펀드와 조합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종속회사 대부분이 영업손실이므로 361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ㅇㅇ업이익의 출처를 공시 재무제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3(당) 기말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 FCF = NOPAT = EBIT x (1-t)
▶ FCF = NOPAT = EBIT x (1-t)
 ▶ Stock Option 부여시 적용한 주식가치
▶ Stock Option 부여시 적용한 주식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