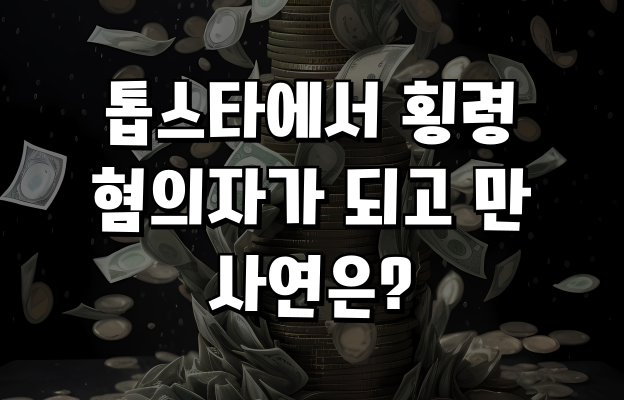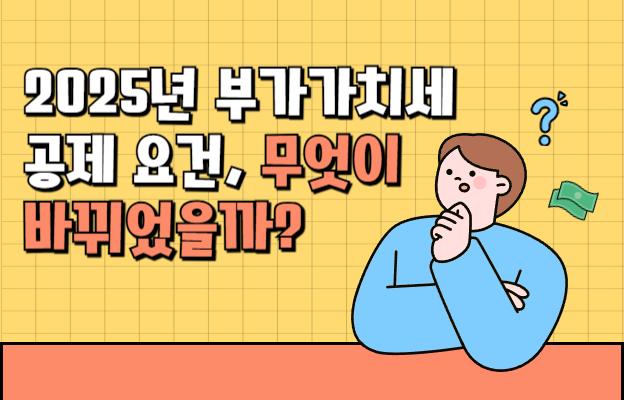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합82185 판결)
BY 판세평 2024.01.31
조회 1385 0유학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교육 및 경험을 얻기 위한 소중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학 경험은 종종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로 유학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pg)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3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0구합82185 판결은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유학경비와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3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0구합82185 판결은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유학경비와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jpg)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pg)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3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0구합82185 판결은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유학경비와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13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0구합82185 판결은 유학경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유학경비와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안의 개요
1992년생인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조모는 매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총액으로는 334,833,374원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원고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의 부친은 2014년경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조모는 2018년경에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원고의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조모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해외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고 증여세(가산세 포함)로 총 280,655,110원을 결정하고 고지하였습니다.관련규정 및 개정연혁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35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30일에 상증세법이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상증세법 제4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연혁과 구 상증세법 제46조는 증여재산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증여세의 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부양의무 여부를 불문하고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생활비, 교육비’를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법 2020구합82185, 2021.7.13., 판결)..jpg)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나,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가 있고 성인인 원고 스스로도 경제력이 있어 원고의 조모를 부양의무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유학기간 중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해외유학 경비를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판단에 대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상증세법 제46조의 규정과 체계, 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이 결정은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규정되었으나, 2003년의 개정에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누어지면서, 이를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조세정책상 이유 등을 고려하여 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상증세법 개정 이유에 따르면,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따지지 않고 비과세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데, 이를 근거로 유학비용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비로 사용된 부분까지 증여세 부과는 다소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최신 포스트